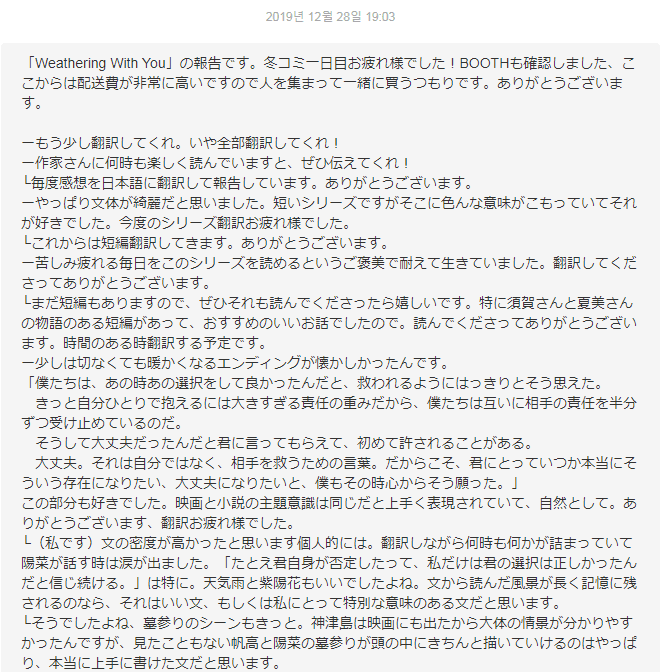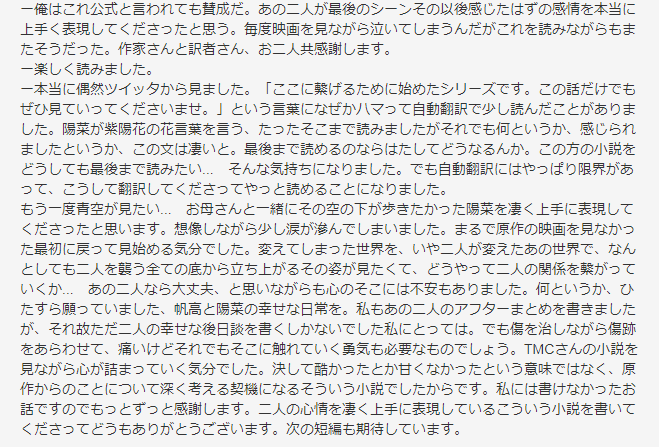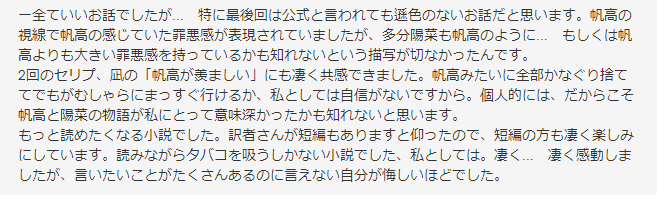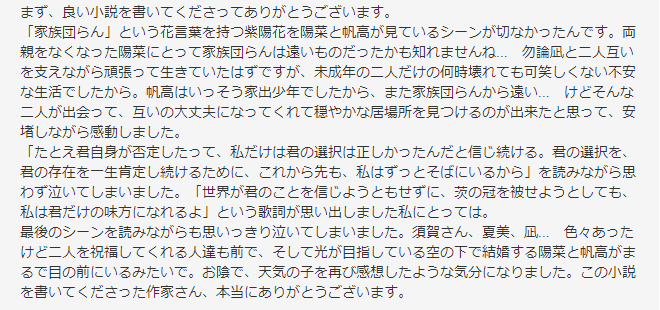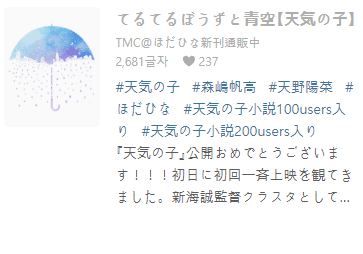
※ 원작자분과의 협의 하에 게제하였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이 작품은 Pixiv의 TMC님의「날씨의 아이」단편입니다.
- 맑음인형과 푸른 하늘
『날씨의 아이』개봉을 환영합니다!!!
개봉 첫날 첫 타임으로 보고 왔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팬으로서 3년간 신작을 기다려온 보람 가득한, 무척이나 아름답고 멋진 영화였습니다.
보고 나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먹먹한 느낌이었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대단히 깊은. 영화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아, 버릇이 되어버릴 것 같은 이 감동을 다시 한 번 맛보기 위해 몇 번이고 극장으로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엔딩 이후, 호다카와 히나의 한때를 상상해본 이야기입니다. 히나네 집에 찾아가는 이야기. 호다카 1인칭입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려온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거리를 뒤덮는 비. 어제도 오늘도 하늘엔 끝간 데 없이 먹구름이 펼쳐져 있다.
반복되는 날씨, 반복되는 비구름. 하지만 오늘 창가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이 어째서인지 평소와는 다른 것만 같아, 긴장으로 경직된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여기.」
히나 씨가 내 앞에 큼지막한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고마워……」
재회한 뒤로 처음 찾아온 히나 씨의 집.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자 집에 찾아오는 건 익숙해지질 않는다. 나는 어색함을 짐짓 얼버무리듯 급히 머그컵을 손에 쥐고 있었다.
내가 도쿄에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그때, 히나 씨는 다시 나기와 함께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모양이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그리운 장식들, 밝은 분위기, 내 기억속 모습 그대로 모든게 남아있다. 이런저런 색깔의 천을 이어붙인 퀼트 커튼으로 장식된 책상, 그리고 창가엔 그 시절과 똑같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장식이 매달려 있다.
「그러고 보니 호다카, 점심은 먹었어?」
「아직 안 먹었는데…… 앗, 하지만 괜찮아.」
내 망설임쯤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이, 히나 씨는 「괜찮으니까 앉아있어」라며 날 앉혀두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든다.
이러고 있자니, 3년 전 내가 가출한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던 그때 즈음, 히나 씨의 집에 처음 찾아왔던 그때 일이 어째서인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분명히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말았다.
그 날── 우리가 세상의 형태를 바꾸어버린 뒤로, 비는 줄곧 그침없이 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런 나날들이 지금은 사뭇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상기후라고 해도 계속 이어진다면 이상기후가 아니게 된다. 우린 그런 나날 속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기다렸지―!」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솜씨좋게 무언가를 만들어낸 히나 씨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요리를 갖고 왔다. 먹음직스러운 오므라이스 위엔 케첩으로 무언가가 그려져 있다.
「자, 얼른 먹어.」
히나 씨가 탁자 앞에 앉더니 날 재촉한다.
「엄청 맛있어보여! ……근데 케첩으로 그려논 이거 말인데, 하마?」
「……개구리야!」
히나 씨는 불만스러운 듯, 하지만 곧 빙긋 웃어보였다.
「잘먹겠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함께 손을 모으며 말했다. 하마로도 개구리로도 보이는 케첩그림을 얹은 오므라이스는, 무척이나 맛있었다.
이렇게나 맛있는 식사는 이걸로 세번째다. 모두 그녀에게 받았던 것뿐이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맛있는 식사의 추억, 히나 씨로부터의 추억이 오늘도 하나 더 쌓여간다.
「오늘은 평소보다도 더 세차게 내리는 것 같아.」
점심을 다 먹고 정리한 뒤, 히나 씨가 비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기 호다카. 맑음인형 만들어 볼까.」
문득 생각났다는 듯 히나 씨는 그리 말하더니 방안에서 티슈상자와 끈, 가위를 들고 왔다. 그리고는 요령좋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간다.
「맑음인형이라.」
「왜?」
「나기 선배가 생각나서. 맑음인형탈 썼을 때, 완전 잘 어울렸으니까.」
「후후. 나기도 건강하게 지내. 그 사이에 키도 많이 컸으니까, 만나면 분명 깜짝 놀랄걸. 오늘은 때가 안 맞았지만 나기도 만나고 싶었대. 그러니까 또 놀러와. ……자, 다 됐다.」
히나 씨가 동그란 얼굴, 하지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밋밋한 얼굴을 한 맑음인형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얼굴은 안 그려?」
「실은, 맑음인형은 처음엔 얼굴 안 그려넣는거래. 맑아진 뒤에 그려넣는대. 맑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이루어졌을 때 그려넣는거래.」
그리곤 히나 씨는 창가에 서서, 얼굴 없는 맑음인형을 처마 끝에 매달고 있었다.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볼까.」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문득 그런 말을 입에 담았다.
「히나 씨.」
「괜찮아. 이제 난 아무 힘도 없는걸.」
안심시키려는 듯 그리 말하곤 그녀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날씨의 무녀가 아닌. 그저 평범한 여자아이로서 그녀는 맑아지길 기도하고 있다. 그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차마 말할 수 없는 불안이 나를 스친다. 도저히 잊히지 않는 그날의 기억이 나를 스친다.
하늘과 이어져 있는 힘. 혹시, 다시 그녀가 끌려가버린다면.
다시, 사라져버린다면.
「역시 난 싫어.」
돌연 히나 씨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언젠가의 아침, 창밖에 비쳐오던 맑은 하늘. 누구라도 환영할 그런 맑은 하늘을 버리고, 나는 그날 히나 씨를 선택했다.
푸른 하늘과 맞바꿨을지언정 이렇게 히나 씨가 있어주기만 한다면. 그 소중함은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이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자, 울지 마.」
「벼, 별로, 우는 거 아니야.」
「여전히 울보구나, 호다카는.」
「울보라니……」
울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새 흘러넘치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런 날 보며 히나 씨가 문득 웃어보였다.
「괜찮아. 자 봐봐, 안 맑아지잖아.」
히나 씨는 창밖을 여전히 뒤덮고 있는 새까만 먹구름을 가리켰다.
「역시 안 되나봐. 이제 나한텐 아무 힘도 없는걸.」
하지만 왠지 별로 아쉽지 않은 그런 말투였다. 내게 있어선 그게 가장 기뻐서. 안도하며 나도 함께 웃었다.
「그걸로 됐잖아. ──아무 힘도 없어도, 난 그런 히나 씨가 좋아.」
문득 중얼거린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숙이던 히나 씨가, 방 한켠에서 매직펜을 들고 오더니 매달아 둔 맑음인형에 얼굴을 그려넣기 시작했다.
「얼굴 그려넣는 거야? 아직 안 맑아졌잖아.」
문득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응. 네 미소를 볼 수 있었잖아. ──하늘 대신 마음이 맑아졌으니까.」
그녀는 날 돌아보며 부끄러운 듯 미소지었다.
그녀의 뒤편, 이제 막 얼굴을 그려넣은 맑음인형도, 마치 그녀처럼 활짝 미소짓고 있었다.
- 지난편에서 원작자에게 번역, 전달된 댓글 및 감상 모음
댓글은 번역해서 원작자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굽신굽신